길 – 김소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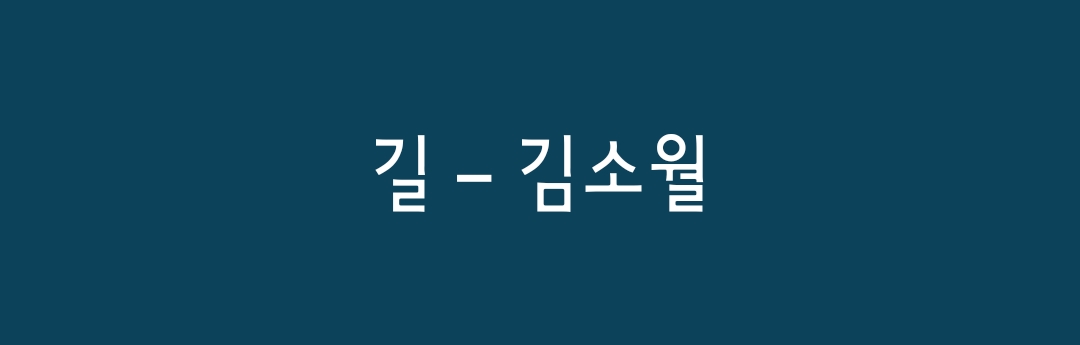
시 전문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가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행간 설명 및 시 해석
1연 (나그네의 외로움과 불길한 징조)
> 어제도 하로밤 / 나그네 집에 /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화자는 길 위의 나그네로, 정착할 곳 없이 떠돌고 있다. "가마귀 가왁가왁"이라는 의성어는 불길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마귀는 전통적으로 불행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새로, 화자의 삶이 불안정하고 쓸쓸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연 (현재의 방황과 고민)
> 오늘은 / 또 몇십 리 / 어디로 갈까.
화자는 여전히 길 위에 있으며, 오늘도 떠나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의 삶에는 명확한 목적지가 없으며, 방황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3연 (길을 찾을 수 없는 현실)
>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 화자를 반기는 곳은 없다. 이는 단순한 공간적 방황을 넘어, 삶에서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표현한다.
4연 (형식적인 고향의 존재)
> 말 마소, 내 집도 / 정주 곽산 /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화자는 자신의 고향, 정주 곽산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단순한 지리적 고향일 뿐,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빼앗긴 나라에서는 고향마저 정착지가 못된다.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그곳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화자 역시 정착할 수 없는 운명임을 보여준다.
5연 (기러기와 자신의 대비)
>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는 공중에서 길을 찾아 이동하지만, 화자는 그렇지 못하다. 기러기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삶의 방향이 정해진 존재를 의미하는 반면, 화자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6연 (방향을 잃은 화자)
>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열십자 복판"은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교차점을 의미한다. 화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삶의 여러 갈래 길 앞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나타낸다.
7연 (궁극적인 절망)
>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 내가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길은 많지만, 정작 자신이 갈 길은 없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는 나그네의 방황과 고독함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존재의 절망을 의미한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삶에서 목적을 상실한 인간의 보편적 모습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감상
이 시는 방황하는 나그네의 외로움과 삶의 방향을 잃은 존재의 절망을 담아낸 작품이다.
첫 연에서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라는 표현은 화자의 고독을 극대화한다. 가마귀의 울음소리는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의 떠돌이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외로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5연에서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러기와 자신의 차이를 강조한다. 기러기는 길을 알고 이동하지만, 화자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이다.
마지막 연에서는 길이 많지만, 정작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삶에서 방향을 잃은 자의 절망감을 극대화한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공감되는 정서로, 목표 없이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과 연결된다.
결국 이 시는 단순한 나그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모든 존재를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길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방황과 외로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임을 시는 이야기하고 있다.
'사색과독서 > 교양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 상상력 (6) | 2025.03.22 |
|---|---|
| 제임스 조이스의 '에피파니' (4) | 2025.03.21 |
|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Kokin Wakashū) (5) | 2025.03.08 |
| 요모츠히라사카(黄泉比良坂, Yomotsu Hirasaka) (6) | 2025.03.07 |
| 히미코(卑彌呼), 일본 야마타이국(邪馬台国)의 여왕 (4) | 2025.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