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권 단편, 옹배기
영산포 출신 작가 오유권!
그는 가난했다. 영산포 남 국민학교를 마친 그는 진학을 못하고 그 학교 급사를 했다. 그의 집은 노봉산 꼭두말 오막살이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자랐다.(작품 '가난한 형제' 배경으로 나온다.) 가난을 이웃하면서 살았던 작가는 고학으로 문학 공부를 했다. 그가 필사까지 하면서 노력해 등단한 해는 1955년. 1928년 무진생이니 27살에 황순원의 추천으로 당당하게 문단에 이름을 올린다.
옹배기
1955년 '현대문학'으로 문단에 데뷔한 그는 이듬해 1월 '옹배기'를 발표한다. 그의 소설 속 인물은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옹배기'의 풍월댁과 반촌댁도 마찬가지. 피난 온 '새집댁'은 더 어려운 처지다. 피난 전에 제법 부유했던 새집댁은 살림이 거덜 나고, 살길 찾아 신북으로 이사를 간다. 영산포에서 영암 쪽으로 삼십리길에 신북이 있다.

소설 속 지명은 작가 주변 지역의 실명이다. 그는 나주 토박이로 작중 인물의 사투리는 입에 착 달라붙는 토속어 그대로다.
소설 '옹배기' 속 인물들
소설 속 반촌댁과 풍월댁은 서로 품앗이를 하는 비슷한 처지다. '품앗이'란 일로 빌려주고 일로 받는 협업 시스템이다. 협력해서 일을 하는 두 사람이지만 경쟁도 남다르다. 신북으로 이사 가는 새집댁 '옹배기'를 차지하려는 두 사람의 경쟁은 치열하다. 한때 잘 살았던 새집댁 물건이라 제법 광이 나는 데다 두 집 모두 옹배기가 필요하던 차다. 200환에 약속을 받은 풍월댁은 반촌댁이 엄두를 내지 못하게 '새집댁이 300환을 요구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화폐개혁 전이라 화폐 단위가 '원'이 아니고 '환'이다. 옹배기를 서로 차지하려는 두 여인네의 전략전술이 눈물겹다. 두 사람의 치열한 경쟁에 새집댁은 새로운 선택을 하고 만다. 피난 초기 식량을 빌려 먹고 아직 갚지 못한 '선이네' 주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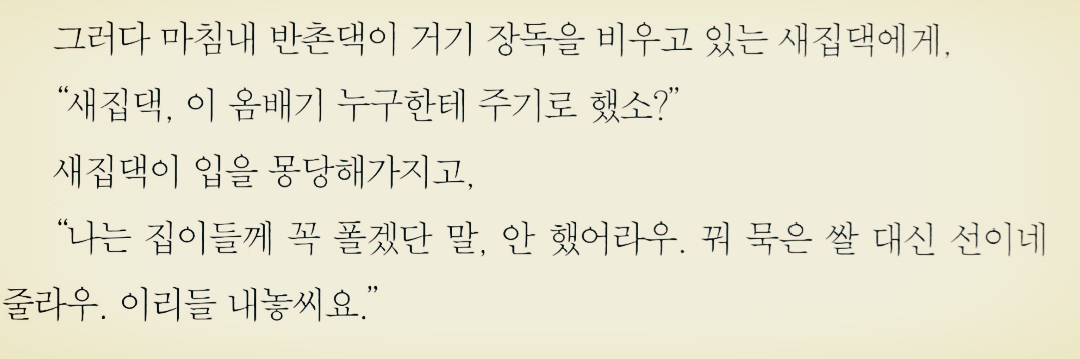
'나는 집이들께 꼭 폴겠단 말, 안 했어라우. 꿔 묵은 쌀 대신 선이네 줄라우. 이리들 내놓씨요.'
걸찬 새집댁의 나주 사투리로 소설은 끝난다.

'사색과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유권 단편] 소문, 1957년 (136) | 2023.10.26 |
|---|---|
| [오유권 단편] 쌀장수, 1956년 (154) | 2023.10.25 |
| [오유권 단편] 참외, 1955년 (182) | 2023.10.23 |
| AI와 대화 (4) | 2023.02.13 |
| 시가 찾아오는 아침 (32) | 2023.02.10 |



